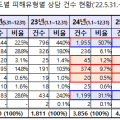‘저출생',‘인구 절벽'. 우리는 이 문제들을 미디어를 통해 숫자로, 그래프로, 그리고 전문가들의 거시적 진단으로 접해왔다. 하지만 이 거대한 담론 속에서 정작 그 중심에 서 있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는지 생각해 본다.
필자 역시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하며 이 문제를 교과서 속 이론으로만 대해왔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대학생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도, 처음에는 막연한 봉사활동의 연장선으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경험은 막연했던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삶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통계 너머에 가려져 있던 사람들의 실제 삶과 인식이 보이기 시작했고, 필자 스스로가 이 문제의‘관찰자'가 아닌‘당사자'이자‘주체'임을 깨닫게 되었다.
활동의 시작은 거리 캠페인이었다.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위해 지하철역에서 만삭 체험복을 입고 시민들에게 핑크라이트 홍보물을 나누어 주었다. 플래카드 뒤에 서 있던 필자에게 다가와 "학생들이 좋은 일 하네”라며 격려를 보내는 어른들의 반응은, 이 문제가 세대를 불문하고‘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공동의 염원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무심히 지나가던 시민들도 학생들의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나마 임산부의 무게를 체험해보려 하던 순간, 스티커 한 장,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체감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아이를 낳아 기르는 삶'을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배려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문제임을 현장에서 배운 것이다.
현장 경험이 감각을 일깨웠다면, 강연과 토론은 사고를 확장시켰다.‘지금의 나이는 과거의 나이와 다르다'는 인구의 날 강연 메시지는 특히 무겁게 다가왔다. AI와 의학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길어진 시대,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인생 설계를 요구받고 있다. 이어진 청년 토론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는 과정이었다.‘청년은 왜 지역을 떠나는가?',‘삶의 균형(워라밸)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같은 현실적인 주제 앞에서,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은 각자의 언어로 같은 고민을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은 더 이상 인구 정책의 수동적인‘대상'이 아니라, 학업, 취업, 주거, 결혼이라는 인생의 과제를 안고 이 변화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서고 있는‘주체'임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필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지속가능한 공동체'에 대해 고민해왔다. 이번 활동은 전공 지식과 현실 문제를 연결하는 귀중한 통찰을 주었다. 우리가 마주한 인구 문제는‘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든다'는 표면적 현상이 아니라,‘청년들이 행복한 미래를 그리기 어려워졌다'는 구조적 문제의 경고등이다. 즉, 해법은‘출산 장려'라는 단편적 접근이 아닌,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즉‘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를 설계하는 데 있다. 이는 건강한 관계의 중요성을 알린 세계 피임의 날 캠페인 경험과도 이어진다. 인구 문제는 결국 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생명과 책임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필자는 인구 문제를 더 이상 두려운 미래나 해결 불가능한 과제로 보지 않는다. 이 문제는 청년 개개인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렇기에 해답의 실마리 역시 우리 청년들 자신에게 있다.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사회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와 함께,‘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작은 용기이다.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전문가일지라도, 그 정책이 뿌리내릴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현장에서의 작은 실천이다. 필자의 경험이 이 문제에 고민하는 또래 청년들과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기성세대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