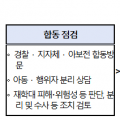윤미향이 주도한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강제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앞세워 저지른 여러의혹들이 이용수 할머니의 두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의기억연대’는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짓밟힌 인권을 되찾고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을 받아낸다”는 명분을 내세워 30여 년간 활동을 해왔으나 정작 그 결과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익보다는 정의연을 이끌고 있는 몇몇 간부 여인들의 권력화와 회계 불투명이 배임, 횡령 의혹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가 5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되사람들(되놈?)이 가져갔다”는 지적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정의기억연대’의 간판 얼굴 역할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하고, 챙긴 수십억대의 기부금품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처리됐다는 것이다. 심지어 모금활동을 한 할머니들이 “배가 고프니 맛있는 것 좀 사먹자”고 해도 “돈이 없다”고 핀잔을 줬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의기억연대’가 아니라 ‘수전노’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의기억연대’는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을 지킨 것이 아니라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을 짓밟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은 친일 팔이의 악랄함의 표본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라는 명칭마저도 애매모호하다. 어떤 정의를 기억하자는 것인가? ‘정의기억연대’의 모체는 1991년 윤정옥, 김문숙 할머니들이 주축이된 ‘사단법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다. 여기서 ‘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자근로정신대’는 ‘일본 국가를 위해 솔선해서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의미로 일제가 노동력 동원을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위안부’는 일본이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제2차 세계대전(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할 때까지 군 위안소에 강제동원돼 성노리개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지칭한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국제신문 보도 인용).
이용수 할머니는 ‘정신대’와 ‘위안부’ 문제를 혼용한 ‘정의기억연대’의 애매한 명칭 그 자체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강제로 끌려간 여성들을 ‘성노리개’ 운운하는 그 자체가 불명예라는 것이다. ‘성노리개’라는 자학적 호칭보다는 강제로, 타의에 의해 붙잡혀 갔으니 ‘강제 위안부’라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를 하나로 묶은 ‘정의기억연대’라는 이름 그 자체가 일제에 의한 피해여성들의 피눈물과 고통을 알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기억상실연대’라는 지적이다. ‘역사관’과 ‘피해 실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황금만능과 투쟁 중심인 ‘정의기억연대’ 주도 세력들은 이제 물러나고 투명하고 깨끗한 새로운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상처받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나설 때가 됐다.
피해 할머니들은 이제 17명밖에 남아 있지 않다. 피해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신 뒤에도 누구를 위해 계속해서 피해 보상과 투쟁을 주장하고만 있을 것인가? 이제는 새로운 역사 정립과 이해가 필요한 때가 됐다.
[2020년 6월 5일 제124호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