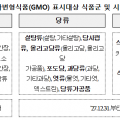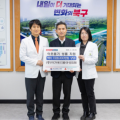“섬에서 밥을 사 먹는 건 상상도 못 할 일이었고 엄마는 오 남매 삼시 세끼 밥뿐만 아니라 새참에 주전부리까지 만드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책 속에서)
부산의 공공도서관에서 30년간 사서로 일한 경력을 지닌 박경자 저자는 울릉도 여인인 어머니와 고향 울릉도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치매가 심해진 엄마를 서울요양병원에 모시게 되면서 잃어가는 엄마의 기억을 담아 두고 싶었어요. 이 책은 김순남 씨가 남긴 이야기보따리죠”
청소년기에는 온통 바다와 산뿐인 섬, 가부장적인 아버지, 몸이 망가지도록 일하는 엄마가 싫어 울릉도에서 탈출하고 싶기도 했다는 저자는 결혼하고 ‘어미’가 되고 나서야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단다.
학력고사 세대인 그가 대학입학 때 도서관학(현재 문헌정보학)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30년간 책을 매개로 시민들과 더불어 보낸 세월은 저를 성장시켰어요. 행복했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직업을 통해 기록의 중요성도 체감했어요”라고 말한다.
후회없이 일했기에 미련도 없었는지, 저자는 부모 돌봄 휴가 끝에 명예퇴직을 했다. 퇴직 후에는 온라인 대학 강의도 하고, 모 재단의 에티오피아 학교도서관 설립 컨설팅에 교육용 자료 제작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도 짬짬이 책을 읽고 글을 썼다.
이번 책의 최종 교정 원고를 넘기고 났을 때 마치 벌거벗은 듯 마음이 복잡했다는 그는, 요즘 집 뒷산인 백양산 둘레길을 수시로 걷고 있다. “나무 그늘에 앉아 바람에 일렁이는 나뭇잎, 어른거리는 햇살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곤 해요. 틈틈이 구운몽, 박지원 소설, 장자 등을 훑어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 추억하면 ‘음식’ 먼저 떠올라
섬사람, 풍경, 맛의 기억 함께 담아내
울릉도서 ‘김순남 씨 책방’ 열 것
책의 주인공인 어머니에 대해서는 “1931년생인 김순남 씨는 농사짓는 농민이었고 자식을 낳고 기른 어미였고 한 남자의 아내로 집안의 며느리로 너무 많은 역할을 하느라 소처럼 일했어요. 그 시대의 많은 여성들이 김순남 씨처럼 살았죠”라며 “조금만 더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목소리를 냈으면 어땠을까”라고 안타까워 한다.
<김순남 씨, 이제 울릉도로 가요>는 생생한 현재형 서술이 인상적인 책이다. 저자는 글을 쓰는 2년 동안 ‘엄마가 계신’ 서울 요양병원, 울릉도를 오가며 썼기에 회상조차 과거가 아닌 현재 일처럼 와 닿았다고 한다. 또, 코로나 19가 심해져 요양병원 면회가 안 될 때는 울릉도에 집에 가서 손때 묻은 살림살이로 밥해 먹고 잠을 자며 보름, 한 달씩 머무르다 나오곤 했다.
독자들은 책을 통해 어머니와의 ‘이별’, 인심 넉넉했던 울릉도 ‘사람’, 울릉도의 ‘풍경’, 울릉도의 맛인 ‘음식’을 다 만나게 되지만, 저자는 이 가운데 ‘음식’에 특히 애착을 느끼고 있다. “음식 한 그릇에는 내게 음식을 만들어 주던 사람, 음식의 재료가 자라던 바다, 산의 풍경까지 담겨 있어요”라는 이유다.
그러면서 “김순남 씨는 자식들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다정다감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밤잠을 설치며 음식을 해서 상 위에 올렸어요. 정을 음식으로 표현했죠”라고 덧붙인다.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모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여성을 가두거나 갇히지 않았으면 했다. “자식을 위해 엄마의 욕구나 삶의 방식이 무시되지 않기를 바래요. 엄마도 한때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던 불완전한 인간이었고 귀한 자식이었죠. 미래를 꿈꾸던 청년이었어요. 엄마가 되었다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여전히 성장 중이고 꿈을 꿉니다”
저자는 기회가 된다면 울릉도에서 ‘김순남 씨 책방’을 열고 몇 년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장소를 알아보는 등 준비 중이다. 사서로서 평생 수많은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력자가 울릉도에서 보낼 시간이 궁금해진다.
그는 “연로하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싶어요. 젊은이들이 찾아온다면 좋겠죠. 찾아오는 이 없어도 괜찮아요. 책방지기 노릇이 지루하면 파도에 떠밀려온 쓰레기도 줍고 산나물 뜯어 밥해 먹으며 지내고 싶어요”라며 활짝 웃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