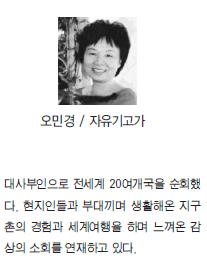
연로한 노인들을 찜통 한국에 놓아두고는 허둥지둥 한국을 떠나와서는 딸네에서 인터넷 전화로 ‘오늘도 무사하셨구나’ 어렵사리 나의 여름은 시작 되고 말았다.
며칠이 지나자 육십대 한국 여자는 인터넷 가르침중의 하나를 떠올린다. ‘과거는 잊고 여기 현재를 즐겨라’ 나는 스위스에 있다. 초록빛 바다에 떠 있는 느낌이다. 초록에 퍼질고 앉는다. 달랑거리는 소 방울 소리와 점심시간을 알려주는 교회종소리와 새소리들 그리고 고요함이 있는 그림속에 파묻힌다.
파주농장에서 주말 밭일을 할때 기운을 내라고 틀어주는 동네가 요란했던쿵작쿵작 가요가 여기엔 없다. 스마트 폰도 티비도 없는 무공해 지역에 힐링 휴가라도 온 것일까.
옆집 마당에서 이 집 마당까지 팔을 뻗치는 풍만한 앵두나무가 있다. 동네처녀 바람났다던 “앵두나무 우물가” 말고 동네 어귀에 오래된 느티나무만치 큰 마을의 비밀을 다 알고 있음직한 그런 나무다.
슬로트머신속의 탐스러운 앵두 그림처럼 빨간 앵두들 아니 체리들이나무 꼭대기까지 소복하다. 앵두나무 주인 로슬린이 키 닿는 곳에서 앵두를 맛보라고 따준다. 로슬린의 아들 후레드는 40세, 결혼해 아이가 둘 되도록 태어난 부모집 바로 옆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
그는 별로 이 땅을 떠나보지 않고 살았다니 늘 움직여야했던 나와 얼마나 대조적인가. 40세 남자가 자기가 태어난 집에 산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한국의 우리세대는 전쟁도 식민지도 피해 살았건만 태어난 집이 보존된 곳은 거의 없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이나라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 그런가 사람들이 조급하지 않고 기지 않는 인상이다.
어제 후레드의 아버지 앙드레가 우리 텃밭을 만들어 주었다. 따가운 햇살아래 웃통을 벗어던진 구리 빛 60대 남자가 괭이로 땅을 파고 트랙터까지 몰고 와 반듯하게 텃밭을 만들었다.그리고는 대형 사다리 두 개를 묶어 앵두나무에 걸쳐놓았다. 리식구들이 마음대로 앵두를 따먹게 하기 위함이다.
아직 대낮 같이 밝은 늦저녁 여름에 나란한 세집이 모여 맥주를 마셨다. 부모와 10미터 거리에 사는 아이들은 행복하다. 카푸신과 세브랑 남매는 벌거벗고 햇살 속에서 논다. 할머니네 정원에서 산딸기도 따서 먹이고 앵두도 따서 먹인다. 수돗물을 먹인다. 아이들의 친정이 너무 멀다고 하소연 하길래 한국보다는 훨씬 가깝지 않느냐며 위로를 해주었다.
대견하게도 그녀는 옆집에 사는 시부모들을 자기 친정집으로 바캉스를 보냈다. 차로 이틀이나 걸리는 곳엘 두 노인들이 다녀왔다. 비행기로 하루 걸리는 한국이나 차로이틀 걸리는 루르드나 휴가 가기는 마찬가지로 흥분되는 거리일 것이다. 벌겋게 바캉스라고 젊고 건강한 노인들 얼굴에 쓰여 있었다.
사돈네 집으로 휴가를 간다? 그것도 며느리네 가족 없이 시부모 내외만 다녀왔다니. ‘사돈과 뒷간은 될 수 있는 한 멀리‘ 문화에서 온 내게 충격이자 부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네 뒷간은 아파트 문화에서 안방 속으로 들어왔으나 사돈은 아직 멀고 어렵다.
영국에 사는 레이몬드는 자기 삼촌과 함께 남자 둘이서 아내의 스위스 친정에 놀러 왔다고 한다. 아내들을 놔두고 어찌 아내 친정에 휴가를게다가 혹까지 붙여 올 수 있단 말인가. 세상은 다양하고 여름은 넉넉하다. 어른이고 사돈이 고간에 서로 성씨가 아닌 이름을 불러 버릇해 그런가. 관계들이 민주적이고 친숙해 보인다.
예의를 생각하느라 스트레스가 삶이 된지 오랜한국의 사돈들이여 이제 그만 재고 친숙한 이웃으로 지내시길. 2013. 7 다이영
[2013년 7월19일 제43호 1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