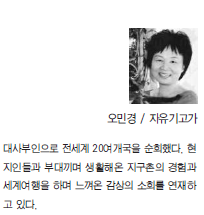
나는 도로 표지판을 성경처럼 여겨 무조건 복종한다.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낯익은 도로명이나 도시명을 만났을 때의 안도감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에 버금간다.
그것이 익숙한 내 나라 땅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다. 도로 표지는 절대적 신뢰를 필요로 하는 기호이며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적 재산이다.
예전에 인구가 적었을 때는 웬만하면 말로 물어서 찾던 길들이 복잡한 세상의 사람들은 기호와 표지를 알아야하는 시대가 되었다. 표지를 읽어내는 능력이 오늘날 더 없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족집게 과외선생님처럼 떠 먹여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전자책 시대에 종이 책이 있어야하는 것처럼 내비가 전능하지만은 않다. 고속도로 번호를 남북으로는 홀수, 동서로는 짝수로 표지한다.
이는 세계 공통으로 어느 나라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도로표지의 색깔과 기호는 국제적으로 공통이 되어 있다. 고속도로 표지판 바탕은 초록색, 박물관등 관광지 안내 표지는 밤색 등. 경부고속도로를 1번 고속도로로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또 최초의 대동맥 도로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표지판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전철역이나 병원 같은 장소 대신 경찰서, 구청, 검찰청 같은 관공서가 눈에 많이 띤다. 몇 년 전 경기도 일산동 대화 전철역을 찾아 가는데 전철역 표지가 보이지 않아 애를 먹은 적이 있었다.
‘일산 경찰서’ 라는 표지판은 쉽게 눈에 띄어서 나는 볼일을 제치고 일부러 찾아갔다. 도로표지판에 전철역을 우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높으신 담당자 말씀이 ‘대화역 전철역이 어딘지는 누구나 다 아는데요 뭘’ 했다. 얼른 생각하면 맞는 말이다.
표지판의 존재 이유는 모르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지역 밖에서 온 사람은 전철역이 어디 있는지 알 리가 없다. 그렇다면 그 지역 밖에서 오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 많이 찾는 장소를 표지판의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닐까?
우리의 표지판 문제는 바로 관치행정의 극치이다.
표지판을 세우는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판단해서 자기식대로 세우는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구청'가는 표시가 아스팔트 바닥에 잔뜩 쓰여 있다.
스위스에서는 표지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모르는 외부사람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만든다. 하필이면 왜 관공서가 표지판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가? 그것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란 말인가? 그보다 전철역은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장소다.
또 외국서는 ‘H’ 자가 병원을 뜻하므로 낫놓고 기역자 몰라도 쉽게 병원이 가깝다는 걸 알 수 있다. 긴급환자 병원이송의 속도여부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지난주 자유로를 달리고 있었다. 초록색 표지판이 갑자기 짙은 쑥색으로 바뀐 걸 발견했다. 세계 공통의 초록색인데 누군가가 짙은 쑥색으로 바꾸어 놓았다. 어색하게 느껴졌다.
세계기준 색채를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세계의 한 가운데 있으니까. 공공재산인 거리 표지판의 색에 있어 빨간색은 위급을 나타내며 소방서가 주로 빨간색을 택한다. 이에 나머지 표지들은 빨강을 피해줘야 할 것이다.
어떤 건물은 전체가 빨강으로 되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자기네 건물이 눈에 띄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겠지만. 빨강은 위급, 소방서에 양보해야 사회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2012년 6월 20일 32호 1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