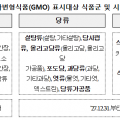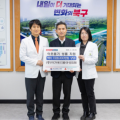영화 '봉인된 시간'
예술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누가 예술을 필요로 하는가, 예술은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사유 끝에 내린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예술은 마치 일종의 사랑 고백과 같은 것이다. 예술은 우리 인간들이 다른 인간들에게 얽매여 있다는 자백과 같은 것이다. 예술은 고백이다. 예술은 삶이 본디 의미를 표출해주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며 사랑이고 희생이다."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예술을 수용하고 평가하는 자의 정신적 무능력은 흔히 다음과 같은 통속적으로 간결화된 상투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맘에 들지 않아!" "재미 없군!" 이것은 강렬한 추론이긴 하지만 무지개를 묘사하려 하는 장님의 추론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술가는 예술창작 과정에서 고통을 겪게 되며, 이는 그런 고통을 통하여 얻은 진실을 남들에게 알려 주기 위함이다. 상투적 표현으로 일축하는 정신적 무능력자들은 예술가의 이런 고통을 알지 못한다.
예술의 기능적 규명은 사고를 촉발시킨다든가 이념을 전달한다든가 혹은 하나의 사례 구실을 하는 데 있지 않다. 아니 예술의 목적은 인간이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의연히 준비하게 하고, 인간이 죽음을 자신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서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데 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고들 말한다, 이 주장은 이른바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옳다, 그러나 이 '과거'란 정확히 무엇인가? 지나간 것이란 과연 무엇인가? 만약 우리들 개개인에게 과거란 현재의 매 순간, 현재의 현실성에서 불변하는 모든 것을 전달하는 존재라면 '지나간 것'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과거는 현재보다 훨씬 더 지속적이다, 현재는 손가락 사이의 모래처럼 흘러내리고 사라져 버려, 오로지 회상을 통해서만 그 물질적인 중량감을 획득한다.
시간 속의 시간,
시간 속의 조각,
그리하여 봉인된 시간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Andrei Tarkovsky 1932~1986)
지난 10월 13일 신선한 충격으로 마치 세상이 아니, 세상을 보는 시각이 많이 바뀐 걸까 하는 착각! 잠시 했었다. 1990년대 이후 노벨문학상 후보에 끊임없이 거론되던 그 이름 무라카미 하루키가 유력하다고 했지만, 스위스 왕립과학원은 밥 딜런의 노래에 대해 “귀를 위한 시(時)”라며 세상을 바꾼 대중문화에 그 상을 수여했다.
60년대 그의 노래 “Like A Rolling Stone”의 가사는 번역이 어떠한들 정말 신금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혹시,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다면 더더욱 가슴에 사무친다. 정말 노랫말 하나하나가 뼈에 박히는 느낌이다.
하여, 국내 학술지에는 그의 노래에 대한 시학적 접근이 논문으로도 제법 많이 올려져 있다. 밥 딜런을 향한 작가 하루키의 시큰둥하지만 따뜻함이 묻어난 축하의 메시지는 그의 존재감을 다시 한 번 주목 시켰다.
하루 키스트들은 노벨 문학상이 발표되는 목요일 저녁 일제히 신사에 모여 수상 발표를 애타게 기다렸다고 한다. 위대한 문학의 탄생을 위한 작가와 독자들은 온 영혼을 모아 수년간 노벨 문학상에 집중하고 있으니, 과연 일본 문학이 뛰어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오랜 시간 함께 쌓아 온 것임을 충분히 입증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여러 작품들은 5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폭발적인 인기와 더불어 마니아 군단을 거느리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전 세계 2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시인 ‘고은’의 작품은 2005년부터 꾸준히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의 시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 ‘상실의 시대’를 읽은 충격은 지금도 그 신선함을 잊을 수 없다. 일본 현대문학의 정신으로 자리 잡은 하루키는 여전히 건재하며 그의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계층의 독자들이 삶에 대한 질문들을 일상처럼 던지고 있다.
진지한 고민 후 올린 답이라고는 그의 명성과 걸맞지 않게 너무나 인간적이고 소소한 것들로 마치 옆집 아저씨와 만난 듯 특별하지 않는 인생의 답들을 들려준다. 질문이 꼬여 있어도 그의 답은 생각 보다 숭고하지 않고 쉽고 친숙함이 묻어난다.
작가 하루키는 그렇게 수많은 독자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흐르고 있었다. 조금 부러운 생각에 앞서 떠오르는 것은 위대함은 그리 멀고 아득한 곳에 있음이 아니라 돌아보면 언제나 내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가 시인 ‘고은’의 시를 읊조렸다. 흥얼대며 입가에 맴도는 그 노래...바로 ‘가을편지’였다. 짧게나마 그의 시 예찬으로 어수선한 모임을 서정으로 이끌어 주었다. 새삼 대중문화 속에 깊이 자리 한 문학과 예술이 인간에게 어떤 형태로 소리 없이 깃드는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술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누가 예술을 필요로 하는가, 예술은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는가, 하는 질문들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사유해야 할 행위의 주체, 즉 작가든 독자든 함께 고민해야 할 즐거움이 아닌가 한다.
이 가을, 어려운 것을 쉽고 단순하게 표현한 우리의 위대한 시인 고은의 가을편지로부터 ‘노벨 문학상의 허리띠를 다시 한 번 졸라 매 보는 것도 독자 된 도리가 아닌가 한다. 예술로부터 떨어져 나간 삶이란 상상하기도 싫음이다.
가을편지
고은 / 시인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맨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헤맨 여자가 아름다워요
이경섭 객원기자
[2016년 10월 25일 제81호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