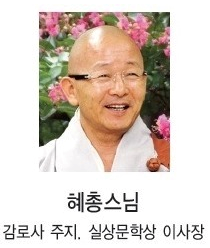
젊은 시절에 한 정신지체장애아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회복지라는 개념도 생소한 시절입니다. 절에서 인연 닿는 복지시설을 위문하고자 찾아가서 신도들과 빨래도 해주고 아이들 밥도 먹여주고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자원봉사인 셈입니다
마침 점심공양시간이었습니다. 일행은 장애아들과 함께 공양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술의 밥을 뜨는 일도 고통이었습니다. 밥을 입에 가져가려고 일그러진 얼굴로 숟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아이는 가슴팍에 질질 흘린 침과 밥알로 범벅을 하였습니다. 그 옆의 아이는 변을 보는데 손이 엉덩이까지 돌아가지 않아 변을 온몸에 칠하고 있었습니다. 알아듣기도 힘든 소리를 지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소승은 차마 그 상황에서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앞에 두고 욕지기가 나서 도저히 공양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지만 수행이 부족한 때문인지 더럽다는 번뇌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몰려오면서 욕지기가 나왔습니다. 순간, 저는 깊은 자괴심을 느꼈습니다. 내면에서 울리는 참회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고통 받는 존재로 태어났다면 어떤 마음일까?’
‘저들이 내 아들딸이었다면 저런 모습 때문에 역겨움을 느끼겠는가?’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토하셨을까?’
‘내가 저들의 몸이라면 내 밥을 먹고 내 똥을 누면서 토할까?’
‘수행자랍시고 입으로는 남에게 착한 일을 닦으라면서 실은 이중인격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절로 돌아와서도 내내 그 순간이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이중인격자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 우울한 생각이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법당에 올라가 참회하면서 이중인격자인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정진했습니다. 그때 소승은 그 장애아동들과의 만남이 인간이란 존재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한마음이 돼 사랑하듯이 사랑을 나눌 때는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원효스님이 당나라로 법을 구하러 가는 길에 해골물을 마시고 마음의 실체를 바로 깨쳤듯이 소승 또한 그때 그 자비롭고 뜨거운 몸짓으로 다가온 스승들께 고개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애만 장애가 아닙니다. 살인하고 폭력하고 사기로 남을 속이는 범죄는 물론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성내고 거짓말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장애입니다. 홀로 계신 부모를 학대하고 봉양하지 않으면서 자신만 즐겁게 사는 것도 장애입니다. 물질이나 권력을 이용해 남을 아프게 하는 것도 모두 장애입니다. 말로써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장애입니다. 눈으로 바른 길을 보지 못하고, 귀로 바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입으로 바른 말을 못함도 장애입니다. 알게 모르게 어둠에 빠져드는 어리석음도 장애입니다.
세상사람 모두가 ‘나의 장애를 바로 보는 깨침’을 발원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
[2022년 7월 22일 146호 13면]









